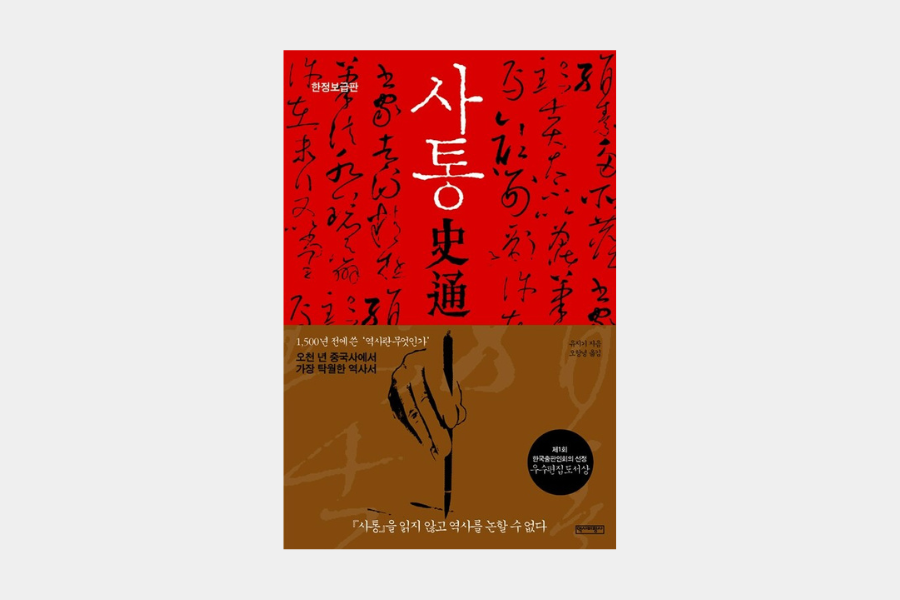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14) ─ 史通, 內篇 - 稱謂
- 강의노트/책담화冊談話 2021-25
- 2025. 2. 13.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사통史通」을 듣고 정리한다.
2025.02.11 δ. 사통史通(14)
텍스트: buymeacoffee.com/booklistalk/shitong-6
칭위稱謂
• "5호가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황제를 자칭하며 각각 나라를 세우니 실질적으로 왕과 같았다"
(융갈칭제戎羯稱制 각유국가各有國家)
"왕이 아닌 도적의 무리로 취급했다. ··· 사사로운 분노가 때문에 공정성을 잃은 것이며, 애증의 감정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여 사안의 득실을 제대로 판정할 수 없었다." (사분私忿 ··· 애증愛憎 ··· 무이정기득실無以定其得失)
• 위수魏收가 편찬한 《위서魏書》, "옛 역사서의 편명을 따라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시 쓰이던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기존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든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애증이 생긴 나머지 제멋대로 명칭을 부여하고", (자아작고自我作故)
"자신의 마음속에서 애증이 생긴 나머지 제멋대로 명칭을 부여하고 다시 그것을 삭제하는 것도 합당한 원칙 없이 자신의 붓끝에서 나왔으니, 이 같은 역사서는 내용도 결코 기준이 돌 수 없고 각각의 편명도 해괴할 뿐이다." (애증출우방촌愛憎出于方寸 여탈유기필단與奪由其筆端 어필불경語必不經 명유해물名惟駭物
• "사론 한 마디, 한 구절은 주의를 기울여 올바르게 작성해야 한다." (사론입언史論立言 리당아정理當雅正)
"어떤 이름을 버리고 채택하는 방식에 변함없는 규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용사지도用捨之道 기례무항其例無恒)
• "옛날에 천자의 묘호를 정할 때는 조祖는 공적이 있다는 뜻이고, 종宗은 덕이 있다는 뜻이다."
"황실의 승계에 따라 황제에 오른 못된 군주였거나 나라를 망친 용렬한 군주들로 영靈이나 무繆라는 시호를 받지 않은 것으로 큰 다행" (승가지벽왕承家之僻王 망국지용주或亡國之庸主)
• "지위는 신하이지만 행적은 제왕에 필적했던 경우" ─ 뒤에 시호를 추증하여 천자의 반열에 올려도 괜찮다. (위내인신位乃人臣 적참왕자跡參王者)
• "명칭을 정하는 방법은 한결같지 않았고 인정과 도리에 따라 만들었기에 본래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 (칭위부동稱謂不同 연정이작緣情而作 본무정준本無定準)
•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따르기 어렵다." (사비윤당事非允當)
한나라 때 원섭이라는 사람이 무덤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을 내고 남양천南陽阡이라고 적힌 표지를 세웠다. 그의 아버지가 애제 때 남양 태수를 지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리고자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는 길(阡)'에 ‘남양南陽'을 붙인 것이다. 이는 경조윤을 지닌 조 아무개가 죽어 무릉에 안장한 후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무덤으로 가는 길을 경조천이라 부른 것을 흉내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려 하지 않았고 다만 원씨천原氏阡이라고만 했다." (인막지긍종人莫之肯從 단운원씨천이이但云原氏阡而已)
유지기의 《사통史通》은 저의 흥취에 따라 읽어보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책을 읽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든가 하는 자부심어린 말은 결코 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읽는 것이 이 텍스트를 올바로 읽는다 라든가 강조하고 길게 말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exēgēsis하고 다르게 didakhē는 말 그대로 교설이다. didakhē라고 일부러 붙여놓은 것은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요, 그저 저의 생각을 텍스트에 더해서 덧붙여 놓은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칭위稱謂는 내용상으로는 본래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많이 얘기를 하게된다. 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다.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꽤나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늘 일상적으로도 그런 문제에 직면한다.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지난번에 진수陳壽가 삼국지를 쓰면서 진晉나라의 정통을 세우려다 보니까 진晉나라가 위魏나라를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결국에는 소급해서 정통을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다. 아직은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때는 아닌데, 중화사상은 상식적으로는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부터 생겨났다. 이게 생겨난 게 사실은 이제 북송 때부터이다. 그전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당나라 때, 유지기는 당나라 사람이니까 당나라 사람들에게는 중화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북방민족이 세운 왕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중화사상을 가리키고 있겠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통에 대한 의식은 삼국지 이때부터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아주 뚜렷하게 삼국이 정치鼎峙했다고 했는데, 세 나라가 딱 대치해서 섰기 때문에 누구를 정통으로 할 것인가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는 꽤나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다. 신라도 통일신라 시대다 라고 말하고 통일신라와 발해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지 않은데 남북국 시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삼국시대 이후로 이제 지금 5호 16국 시대가 이어지고 남북조 시대가 그다음에 이어지고 그다음에 수나라와 당나라, 당나라야말로 저기 대당제국이라고 해서 군대가 군대가 굉장히 강성했고 당시삼백수를 읽어봐도 변방에서 쓴 시들이 꽤나 많은데 왜 당나라의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예로부터 당나라 군대가 왜 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다음에 오대십국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북송이 있다. 5호五胡라는 것은 5개의 오랑캐라는 뜻인데, 북방에 있던 선비족이나 흉노 5개 종족이다. 여기에 보면 "5호가 화북 지역을 차지하고 황제를 자칭하며 각각 나라를 세우니 실질적으로 왕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다. 융갈칭제戎羯稱制, 황제를 자칭하며 제도를 만들었다. 각유국가各有國家, 각각 나라를 세우니 실질적으로 왕과 같았다. 왕이나 다름없었다는 말이다.
진晉나라에 반기를 들어서 화북 지방을 점령을 하고 16개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탁발씨가 화북을 통일해서 북위北魏를 건국했다. 이제 살아남은 한족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한족이 살고 있지 않던 지역인 장강長江(양자강) 망명을 해거 동진東晉을 세웠다. 그리고 송宋으로 교체되었다. 나중에 북송의 송이 아니라 송으로 교체되었다. 그래서 남쪽에는 동진과 그에 이은 송, 그리고 북쪽에는 북위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그런데 북방에서는 북위가 다시 동서로 분열해서 서위, 동의로 나뉘었다가 그다음에 동의는 다시 북제로 나뉘고 그다음에 서위는 북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북주가 또 북제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북주가 수나라가 된다. 남쪽에 와 있던 송이라는 나라는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이어지다가 수나라가 남쪽에 있는 진나라를 또 병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589년에 성립을 하게 된다. 미야자키 이치사다가 쓴 《수양제》에 이 얘기가 나와 있다. 그런데 수나라도 얼마 못 갔다. 그래서 30년도 못 가고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당나라가 들어왔는데, 618년에 세워져서 300년을 간다. 그러다가 멸망당하고 오대십국 시대가 열리고, 그때 북송의 조광윤이 그런 것들을 병합해서 통일을 완성했다. 북송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북방민족이 세웠다 라는 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북송과 거란이 한 번 싸웠는데 거기서 거란한테 혼줄이 나가지고 매년 10만 냥의 은과 20만 필의 비단을 바치는 이른바 전연의 맹약을 맺는다. 5호 16국부터 북송까지가 중국 천하가 난리가 나는 때이다. 그러니 당연히 황제를 자칭하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칭호가 아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진수陳壽의 삼국지에서는 자신들의 군주와 선조를 편들고 중화를 어지럽힌 5호를 증오해서 왕이 아닌 도저의 무리로 취급했다. "사사로운 분노가 때문에 공정성을 잃은 것이며, 애증의 감정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여 사안의 득실을 제대로 판정할 수 없었다." 사분私忿, 사사로운 분노, 무이정기득실無以定其得失, 사안의 득실을 제대로 그 득실을 정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그러진 사례를 보자면, 위수魏收라는 사람이 편찬한 위서魏書를 보면 "옛 역사서의 편명을 따라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시 쓰이던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기존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든 것이다." 자신만의 원칙, 자아작고自我作, 잘 만들었으면 좋은데 잘 안 만들었다는 말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애증이 생긴 나머지 제멋대로 명칭을 부여하고 다시 그것을 삭제하는 것도 합당한 원칙 없이 자신의 붓끝에서 나왔으니, 이 같은 역사서는 내용도 결코 기준이 돌 수 없고 각각의 편명도 해괴할 뿐이다." 애증출우방촌愛憎出于方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애증이 생긴 나머지 제멋대로 명칭을 부여하고, 여탈유기필단與奪由其筆端, 명칭을 제멋대로 부여하고 빼앗는 것도, 붓 끝에서 나왔다. 어필불경語必不經, 그 말도 반드시 기준이 될 수 없다. 명유해물名惟駭物, 편 명칭도 놀라운 물건이다.
그러면 지금 안 좋은 사례만 쭉 말을 했으니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준을 보면 "사론 한 마디, 한 구절은 주의를 기울여 올바르게 작성해야 한다." 사론입언史論立言, 사론의 말은, 리당아정理當雅正, 이치가 마땅하고 곧바라야 된다. "어떤 이름을 버리고 채택하는 방식에 변함없는 규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용사지도用捨之道, 쓰고 버리는 그 방식에, 기례무항其例無恒, 변함없는 예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놓고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얘기한다. 보충해서 얘기해 보면 "명칭을 정하는 방법은 한결같지 않았고 인정과 도리에 따라 만들었기에 본래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 그러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문제인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리에 따라서 포폄을 해서, 그러니까 식견의 문제로 생각한다. 칭위부동稱謂不同, 명칭을 정하는 방법은 늘 같지 않다, 연정이작緣情而作, 인정에 따라서 정하고, 본무정준本無定準, 본래 정해진 기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옛날에 천자의 묘호를 정할 때는 조祖는 공적이 있다는 뜻이고, 종宗은 덕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못된 놈들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다. "황실의 승계에 따라 황제에 오른 못된 군주였거나 나라를 망친 용렬한 군주들로 영靈이나 무繆라는 시호를 받지 않은 것으로 큰 다행", 승가지벽왕承家之僻王, 벽僻이라는 것은 착실하지 못하다 후미졌다고 할 때, 그러니까 못된 군주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망국지용주或亡國之庸主, 나라를 망친 용렬한 군주이다. 그런데 "지위는 신하이지만 행적은 제왕에 필적했던 경우", 위내인신位乃人臣, 지위는 신하지만, 적참왕자跡參王者, 그 행적은 제왕에 필적한 경우에는, 뒤에 시호를 추증하여 천자의 반열에 올려도 괜찮다. 그래서 사마천이 공자를 열전에 쓰지 않고 세가에다 쓴 거 아니겠는가.
그래도 가장 좋은 그 방법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다.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따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비윤당事非允當,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따르기 어렵다. 이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평판을 하는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래서 얘기를 길게 써놓았다. 한서 유협열전에 나온다고 하는데, 한나라 때 원섭이라는 사람이 무덤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을 내고 남양천南陽阡이라고 적힌 표지를 세웠다. 그의 아버지가 애제 때 남양 태수를 지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리고자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는 길(阡)'에 ‘남양南陽'을 붙인 것이다. 이는 경조윤을 지닌 조 아무개가 죽어 무릉에 안장한 후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무덤으로 가는 길을 경조천이라 부른 것을 흉내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려 하지 않았고 다만 원씨천原氏阡이라고만 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치이다. 인막지긍종人莫之肯從,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말이다. 단운원씨천이이但云原氏阡而已, 다만 원시천이라고 불렀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든다.
'강의노트 > 책담화冊談話 2021-25'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13) ─ 史通, 內篇 - 稱謂 (0) | 2025.02.10 |
|---|---|
| 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12) ─ 史通, 內篇 - 序傳 (0) | 2025.02.09 |
| 책담화冊談話 | 옥스퍼드 세계사 1-2 ─ 세계사 읽기의 목적과 방법, 제1부와 제2부에 대한 간략한 개관 (0) | 2025.02.07 |
| 책담화冊談話 | 옥스퍼드 세계사 1-1 ─ 세계사 읽기의 목적과 방법, 제1부와 제2부에 대한 간략한 개관 (0) | 2025.02.07 |
| 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11) ─ 史通, 內篇 - 編次 (0) | 2025.02.02 |
| 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10) ─ 史通, 內篇 - 斷限 (1) | 2025.01.27 |
| 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9) ─ 史通, 內篇 - 序例, 題目 (0) | 2025.01.20 |
| 책담화冊談話 | 사통史通(8) ─ 史通, 內篇 - 序例, 題目 (0)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