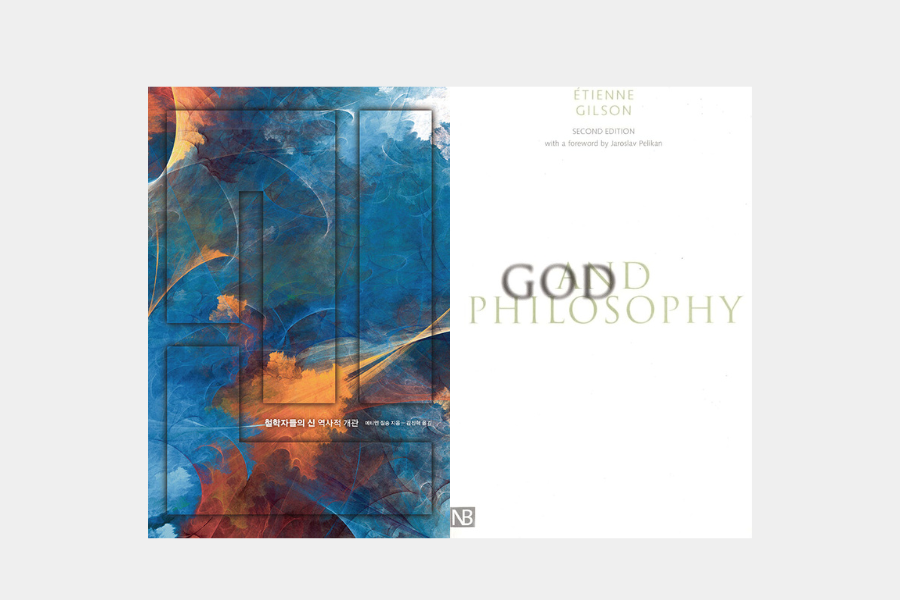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ε. Gilson, God & Philosophy」를 듣고 정리한다.
2024.05.26 ε. Gilson(13), God & Philosophy, Ch. 2
에티엔 질송, ⟪철학자들의 신 - 역사적 개관⟫(God and Philosophy, 2002)
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god-philosophy-ch-2
에티엔 질송의 신과 그리스도교 철학 첫 번째 부분에 신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기독교의 신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신의 특성이다. 질송도 창세기라든가 신명기 또는 출애굽기 이런 구약성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대인의 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의 신의 특성으로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에서처럼 율리아누스라든가 포르퓌리오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논박되면서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반론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심각한 반론에 직면하게 되면서 칼케돈 신조로 귀결된, 율리아누스 시기에 키릴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삼위일체 논쟁을 한다. 아레이오스를 물리쳐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인 권력 속에서 일종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다음 정통orthodox으로 정초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론적 · 신학적 · 형이상학적인 요구가 있었다. 그 요구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신 개념을 그대로 두고 있는 한은 결국 아레이오스가 정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아레이오스가 정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이론적으로 정초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요즘 우리가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종말론적 공동체를 기다리는 하나의 천년왕국적 집단으로 그쳤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는 하나의 신앙 체계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결국 플로티노스나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이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대교에서 신은 역동적으로 존재하고 현존하고 활동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 신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chasm이 있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전적으로 신이 인간을 은총으로 뭔가를 해주는 것 아니면 인격적 관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 철학자는 I AM WHO AM. HE WHO IS를 제일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이긴 한데 그리고 그것은 실존적인 것existential이다. 그런데 유대교의 신과 기독교의 신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창세기 22장 1절과 22장 11절, 그러니까 아케다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야훼와의 대화가 있다. He said to him, “Abraham!” And he said, “Here I am.”
창세기 22.1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Genesis 22.1 After these things God tested Abraham. He said to him, “Abraham!” And he said, “Here I am.”
창세기 22.1 1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큰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야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Genesis 22.1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to him from heaven, and said, “Abraham, Abraham!” And he said, “Here I am.”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1 나 바울로와 실바노와 디모테오는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카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THESSALONIANS 1.1 Paul, Silvanu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Grace to you and peace.
이 대화를 보면 Here I am, 즉 신과 마주 서 있는, 신 앞에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chasm이 있다. 그런데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장 1절을 보면 파울로스가 이렇게 규정을 한다.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신약성서 원전에 따르면 "안에 있는"이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 안에 있는, 신성을 경험하는 ekklēsia이다. "en theō patri kai kyriō Iēsou khristō te ekklēsia Thessalonikeōn", "아버지 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제는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신적인 차원으로 무한자의 영역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매개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플로티노스는 일반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아우구스티누스로 매개하는 경로로 알려져 있다.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을 《고백록Confessiones》 7권 9장 13절에서 자신의 이해를 얘기한다.
《고백록》7.9.13 무엇보다 당신이 제게 보여주려고 하신 바는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점과, 당신의 말씀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실 만큼 겸손의 길을 통해서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만심이 대단하던 어떤 인물을 통해서였지만 플라톤학파의 모모한 책들,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서적들을 제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읽은 바는, 다음에 나오는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대강 이런 내용을 다양한 논지로 깨우쳐주는 것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 앞에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느님 앞에 계셨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생겨난 것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분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거기서는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당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만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는 내용은 읽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플로티노스를 읽었고 그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지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Confessiones》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플로티노스를 어디까지 어떻게 읽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문을 어떻게 인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보면, 플라톤을 직접 읽은 것인지 아니면 플로티노스가 수정한 플라톤을 읽은 것인지를 구별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는 아니다. 이것을 어쨌든 플로티노스가 플라톤을 읽었고 그렇게 플로티노스가 읽은 플라톤을 플로티노스를 경유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읽었고, 그렇게 읽은 것을 다시 성서에 비추어, 특히 요한복음 1장에 비추어서, 재해석한 내용을 《고백록Confessiones》에서 써놓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질송은 참고 문헌을 제시해서 이 경로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엔네아데스》를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연구해야 된다. "역사적 사실들에 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좋은 소개로 다음을 보십시오."하면서 Charles Boyer를 거론하는데 이 책이 과연 그렇게 어떠 한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성균관대학출판부에서 번역이 되어 나온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이해》의 서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조할 수도 있겠다. 이 책은 lecture이기 때문에 참조해서 봐야 될 것들은 상당히 생략되어 있고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다. 가능한 한 이런 것 저런 것을 찾아서 제시를 해두고는 싶은데, 플로티노스가 플라톤을 어떻게 읽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플로티노스를 경유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어떻게 읽었는가 그리고 다시 성서에 비추어서 재해석한 경로는 또 어떠한가 라는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질송의 뼈대를 추려서 얘기하고자 하는, 질송은 중세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이 두 사람만을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그렇다. 중간에 안셀무스라든가 또는 보나벤투라는 딱 필요한 만큼만 다시 거론을 하겠다.
일단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을 한번 보겠다.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이 그대로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플로티노스가 플라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가.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플로티노스의 《엔네아데스》를 바탕으로 보면 일단 플로티노스는 hen(the one)이 있다. Hen Kai Pan(One And All)이라고 하는 헬라스 철학의 기본 구도, 일자一者와 만물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그대로 플로티노스 형이상학의 기본 구도가 된다. 그런 점에서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주의이고,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henōsis, 일자성一者性, 일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oneness 또는 unity라고 번역이 되는데, 자립적 단순성,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테제가 "일자가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다 if the one is not, nothing is."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명제는 플라톤의 대화편 《파르메니데스》166c, 166c는 결론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일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신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적인 것을 낳아놓는 신적인 것들, 즉 pan을 낳아놓는 제1원리로 볼 수도 있다. 질송은 플로티노스라든가 또는 플로티노스가 읽은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라든가 이것을 제1원리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았다. 우리가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플로티노스의 존재 질서가 있다. 제1원리인 hen이 있고, 이 the one의 henōsis라는 것은 분할 불가능성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nous, 영어로 번역하면 Intellect, 지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지성이라는 번역어보다는 정신이라고 하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nous가 emanatio, 즉 흘러나온다. emanatio를 거슬러 가면 illuminatio이다. 이 지점, emanatio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 emanatio와 상응하는 게 illuminatio이다. hen이라고 하는 것은 앎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그것을 정신을 통해서만 지성으로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동시에 그것은 다수성의 원천은 될 수 없다. 그것이 다수성의 원천이 되려면 분할 가능해야 되는데 분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으로서는 알 수는 있긴 하지만 분할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지성으로서 알 수는 있지만 분할 가능한 것이 제2원리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nous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가시적 다수성의 원천이고, 우리가 이 nous를 안다고 하면 모든 것에 대한 앎이고 이데아가 있는 장소라고 질송은 해석을 한다. hen과 본성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다수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즉 분할 가능한 것으로서의 nous가 제2원리이다. 이것을 질송은 플로티노스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읽었다 라고 파악한다. 즉 어떻게 읽었는가, 성서를 입혀서 읽는 것이다.
78 지성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영원히 지속하는 인지라는 점에서, 정의상 플로티노스에게 지성은 모든 이데아가 있는 장소입니다.
플로티노스를 읽음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를 읽은 것이 되고 그 《파르메니데스》를 바탕으로 플로티노스가 적어둔 것을 아우누스티노스가 읽는데, 그렇게 읽는 과정에서 요한복음을 입혀서 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1장 3절인데, 이것을 《파르메니데스》 166c와 같이 읽는다는 것이다. "일자가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다"를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읽었는데. 여기서 말씀logos를 어떤 영역에다 두는가. 성부인 신은 hen이다. 그리고 말씀logos가 바로 지성nous이다. 그 nous로부터 피조물의 세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사실 정통적 삼위일체론에 따르면 말씀이 곧 성부이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그렇게 읽은 게 아니라 성부인 신은 hen으로 읽고. 그 신과 함께 있던, 사실 성서에는 "함께 있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티노스는 그것이 nous가 emanatio되었다고 얘기를 한다. 이 지점에서 묘한 어긋남이 생겨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은 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먼저 요한복음을 읽었을 것이고,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를 읽었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의 원리로 봐야 되는데, 운동의 원리라고 하면 이것이 뭔가 생산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할 가능한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을 것이고, 분할 불가능한 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서로 충돌되고 있는 지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래서 플로티노스의 도식을 가져다가 이것을 3개의 질서 영역으로 나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성부인 신, 로고스인 신 그다음에 피조물의 세계.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변을 읽어보고 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우리 인간 존재를 비롯한 피조물의 세계를 거대한 신적 질서 속에다가 집어넣지 않는다. 그건 결국 유대교의 신 개념을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한 것이다. 극복해내는 최대치가 우리는 신과 또는 말씀인 로고스와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이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피조물과 신의 관계는 거기까지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자연물들에 대해서는 신학적 논변을 못 내놓는다.
요한복음 1.3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80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신과 함께 계셨고 신과 똑같은 분이셨다.' 요약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엔네아데스』를 읽자마자 성부 신, 말씀 신, 피조 세계라는 그리스도교의 세 가지 핵심 관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취약했고 이것을 Thomism에서는 상당히 견고하게 그 부분을 파고들었다. 이것은 Thomism에서도 많이 세분화된 영역인 principium individuationis, 즉 개체화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질송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는 없다. 이것은 별개의 영역이다. 근대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이 가능하려면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염두에 두고,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고려를 했겠지만 이 부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계 속으로 집어넣기는 굉장히 곤란함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고백록》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변이 없다. 의도적으로 피해가지 않았나, 이것을 아젠다로 삼으면 충돌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플로티노스를 통해서 헬라스 사상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직 헬라스 사상의 자장, 힘의 영역 안에 들어 있다. 로고스가 육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몸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과 로고스로부터 emanatio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게 구별이 되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구체적인 인간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전화transformatio되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인간 예수가 Khristos로 질적으로 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육화이다. 그래서 주Kyrios가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인간을 매개로 해서 Khristos가 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로고스가 예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가 바로 Khristos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개체적 인간,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간 속으로 말씀이 들어온 것이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와 충돌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각각의 개체들이 모두 다 신적 본성, emanatio를 통한 산물인지 아니면 incarnatio를 통한 산물인지, 그러니까 육화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유출인가 육화인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놓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생략하고 지나갔다고 할 수 있다. 플로티노스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얻어온 것은 제2원리인 nous가 모든 것에 대한 앎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어왔다고 봐야겠다.
그러면 플로티노스의 세계와 기독교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교적 신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신이고 생동하는 신이고 움직이는 신이고 역사하는 신이다. 사물 속에서 뭔가를 하는 역사하는 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Here I am, 인간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현전하는 타자인 인간, 현존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을 늘 그대로 실현하는, 본질태가 온전하게 실현되어 있는 것을 "현존하는"이라는 뜻으로 쓰고, "현전하는"은 우연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변적으로 존재할 뿐인 것을 표시하는 말로 쓰는데, 사물의 실존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것은 일자가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즉 여기서 일자와 사물의 관계 문제는 신플라톤주의와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신플라톤주의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일자이고 그래서 자신 안에만 그 일자가 머무른다. 그런 본성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 우주는 일자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emanatio가 필연적이다 라는 말이다. 그래서 일자에서의 흘러나온 nous가 최고신이고 nous를 포함하는 다수성pan의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다수성 사이에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즉 hen은 hen이고 pan은 pan인데 그것들의 본성 자체가 절대적 차이가 있다. the one and all의 절대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hen이 pan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주권자로서는 아니다. hen은 hen대로 자족적 세계 속에서 그대로 있고, 어쩌다 보니 뭐가 hen으로부터 흘러나와서 nous가 형성되었고 nous를 나누어 가진 pan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pan의 세계에는 nous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embeded, 다 묻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묻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실은 hen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나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다. 필연적 관계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유대교의 신, 인간이 그 앞에 있는 절대적 타자로서 있는 신, 신과의 관계를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을 가져다가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권자가 될 수 없다. 주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출은 불가능하다. 주권자의 문제가 여기에 걸린다. 즉 Kyrios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면 신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존재이면서 신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신적인 뭔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것은 플로티노스에서 나와 있지만 플로티노스에서는 hen은 결정적으로 주권자가 아니다, 신의 주권이 관철되면서도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이성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냥 어쩌다 보니 유출된 것도 아닌 신의 적극적인 행위actio에 의해서 가능해진 인간과 세계, 이것을 생각을 하려면 방법은 창조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실존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신에게 실존을 부여받은 피조물들은 유한하고 부분적인 모방물 finite and partial imitation, 즉 creatio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송도 지적하고 있듯이 현존하는 신과 현전하는 인간 사이에는 infinite metaphysical chasm이 있다. "무한한 형이상학적 단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신의 의지에 따른 활동만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플로티노스의 hen metaphysica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플로티노스의 hen metaphysica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들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뭔가 둘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확보한 것은 creatio이고, 신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chasm이 있다. 번역본은 "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단절, 딱 끊어져 있다. 신의 의지의 활동만이 bridge를 놓을 수 있다.
84 신의 실존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영원히 그 자체로 '있는 나'에 대한 유한하고 부분적인 모방으로서 존재를 부여받습니다. '있는 나'가, 그 자체로는 있지 않은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는 이 활동을 그리스도교 철학에서는 '창조'라고 부릅니다.
85 '있는 나'와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형이상학적 골이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유일한 물음은 인간은 이성으로서 신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신과 나누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성이 바로 이성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신과 나누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이다. 이게 자연신학의 근본 문제이다. 자연nature를 신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으로서 설명하려는 신학이다. 가령 천체 물리학은 이 우주를 설명할 때 어떤 궁극적인 제1원인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 눈앞에서 발견되는 또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의 도움을 빌려서 그 도구로써 찾아낸 것들을 계속 조각조각 쌓아 올릴 뿐이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우주에 대한 이해를 늘려 나갈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늘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박하고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나날이 우주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더 metaphysical mind를 가진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우주에 대한 앎을 늘리고 있는 것인가, 우주는 무한한가 유한한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한하다고 정해져 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것은 언젠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있겠다. 그런데 그건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전제하지 않는 지속적인 전진 밖에 없다. 자연신학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즉 현전하는 사물들을 자연nature이라고 보고, 이 자연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질서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가, 어떤 질서 속에다가 자연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 결국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는 현전하는 유한한 사물들과 그것들이 완결된 시스템 사이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자연신학의 문제이다. 중세는 자연신학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인간의 이성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점검을 해야했다. 그래야 그다음에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그다음에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이룰 수 있다 라고 대답하면 자연신학의 가능성이 열리고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지겠는데,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단념하게 되면 natural theology가 아니라 natural science가 된다.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열어놓고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야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나 형이상학자가 보기에는 절망의 학문이고,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쌓아올린다고 하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이고 부질없는 짓이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귀결을 생각을 하면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끌어온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를테면 자연과학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의 앎이 하나가 늘어났다 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심연으로 다가가는 것을 잊고 있는 그런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즉 natural theology의 입장에 설 것인지 아니면 natural science의 입장에 설 것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86 인간이 어떻게 오직 이성으로만 '있는 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신학의 근본문제입니다.
86 이 문제를 풀고자 노력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노스가 수정한 플라톤의 철학적 기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한 방법은 플로티노스가 수정한 플라톤의 철학적 기법이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를 가져온 것이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을 때 말씀을 logos로 보았고 이 logos를 hen에서 유출되어 나온, hen에서 emanito된 nous로 읽었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플로티노스가 수정한 플라톤의 철학적 기법이라고 질송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illuminatio이다. 흘러나오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illuminatio이다. 이 아이디어가 보나벤투라에도 연결되는데, 가령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순례》가 그렇다.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안셀무스 칸투아리엔시스, 둔스 스코투스, 데카르트, 데카르트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에 기원을 둔 신학이다. 스콜라주의하고는 아주 다르다. 오늘 처음 얘기한 것처럼 스콜라주의는 자연철학에서 개체화 원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신적 특성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일단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지고 있는 신비신학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노스가 수정한 플라톤의 철학적 기법을 가지고 얘기한다.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의 상기anamnēsis 이론을 해석하면서 플로티노스의 변증법이라는 것이 정립이 되는데, 인간의 영혼이 모든 물질적 심상에서 벗어나 지성으로서야 알 수 있는 이데아들을 관조하기 위한 노력, 그것을 변증법이라고 본다. 플라톤하고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로티노스와 플라톤은 조금 다른 게 있다. 두 사람의 변증법의 차이가 있다. 먼저 플로티노스의 변증법은 인간의 영혼이 물질적 심상에서 벗어나 가지적 이데아들을 관조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영혼과 물질적인 것의 관계, 이 관계가 플로티노스와 플라톤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sōma, psykhē, nous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기는 하겠지만,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sōma, 즉 육체, 물질 그다음에 psykhē, 영혼, 혼 그리고 nous 또는 pneuma, pneuma라는 말은 플라톤은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플라톤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세 개가 아주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플로티노스가 수정한 플라톤의 철학적 기법, 플로티노스가 수정을 했을 때 무엇을 수정했는가, 어디까지 수정했는가 할 때, 일단은 플로티노스가 아주 구별되는 3분법으로 나누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본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3분법, 그러니까 플라톤에게도 명시적 3분법으로 볼 만한 것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이 아주 명시적으로explicit 3분법을 했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플로티노스는 명시적 3분법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질송도 그렇게 본다. 플라톤을 플로티노스가 수정한 방식으로 읽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읽으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가령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국가》에서는 그렇게까지 3분법이 거론이 안 되고, 《티마이오스》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주 뚜렷하게 스토아주의자이기 때문에 3분법을 가지고 있다, sōma에 대한 아주 심한 경멸이 있다. 그런데 플라톤은 sōma를 심하게 경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영혼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음에 플라톤의 인간관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다.
어쨌든 플라톤의 인간관을 플로티노스는 명시적 3분법으로 보았고, 그것을 일단 플로티노스의 것으로 넣고,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질송에 따르면, 요한복음서를 읽긴 읽는데 플로티노스의 《엔네아데스》로 읽어냈다고 했다. 그러니까 플로티노스의 《엔네아데스》 구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서를 읽었다. 그러면 《엔네아데스》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성부인 신, 말씀logos인 신 그다음에 피조물 이렇게 3분법이 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분리로 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만이 신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sōma는 버려진다. 인간의 영혼만이 신적인 부분이고, 인간의 영혼은 신이 인간에게 남겨준 신의 흔적, 즉 자기 영혼 안에 현전하는 신의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의 영혼을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인간의 영혼은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이성의 흔적이다. 온전히 그대로 같은 게 아니라 말씀logos만이 참다운 빛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안에는 참다운 빛이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다운 빛이 흔적의 형태로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신의 빛이 하강되어 있는 자리이고, 《고백록》을 읽을 때 자리 얘기 나온다, 그다음에 그 자리를 뚜렷하게 자각한 다음 그 자리로부터 신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자각, 즉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자리로부터 영혼을 상승시켜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된다. 신의 온전한 빛이 인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 신의 흔적만이 들어와 있다. 말씀logos는 참다운 빛이고 그 로고스가 인간에게 흘러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플로티노스를 읽은 것이다.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일단 플라톤을 잊어야 된다. 플루티노스의 하강, 플로티노스에서 emanatio는 그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 흘러나온 것인데, 이 부분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넣어준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온전히 다 넣어주지 않았다. 그러니 신이 나에게 이것을 넣어주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이것을 넣어준 존재를 향해 가는ad te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에 이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두고 그다음에 플라톤의 인간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해보겠다.
'강의노트 > 책담화冊談話 2021-25'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5), God & Philosophy, Ch. 2 (0) | 2024.06.03 |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6-2 (0) | 2024.05.31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6-1 (0) | 2024.05.31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4), God & Philosophy, Ch. 2 (1) | 2024.05.29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5-2 (0) | 2024.05.24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5-1 (1) | 2024.05.24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8) [9] (1) | 2024.05.22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7) [8] (0) | 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