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7) [8]
- 강의노트/책담화冊談話 2021-25
- 2024. 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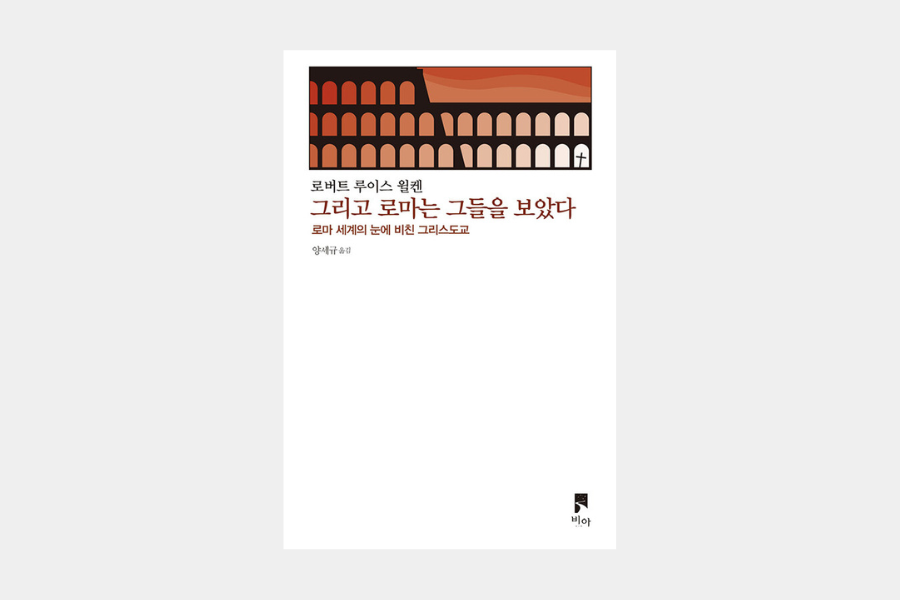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를 듣고 정리한다.
2024.05.20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7) [8]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제6장 포르퓌리오스 - 철학자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거론을 하고 내일은 포르퓌리오스에 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율리아누스를 덧붙여서 말하고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포르퓌리오스 앞에 켈소스 얘기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다. 포르퓌리오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고 싶고, 율리아누스는 일반적으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괘씸한 자로 알려져 있는데 로버트 루이스 윌켄은 이 사람을 개종자라고 불렀다. 기독교도였다가 고대 세계의 전통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율리아누스는 황제였기 때문에 포르퓌리오스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유념해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치 체제는 공적인 경건함, 즉 종교가 하나의 공적인 업무로서 제시되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체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국교로 선포된 것 못지않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체제의 구성 요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율리아누스는 로마 제국 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다. 율리아누스가 가지고 있는 또는 제시한 그런 근거는 포르퓌리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마련되었다. 책을 읽어보면 율리아누스에 관한 설명에서 "포르퓌리오스가 제기했듯이"라는 토를 달아서 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퓌리오스에 대해서 두 번 하고 거기에 살짝 덧붙여서 율리아누스가 로마 제국 체제에서, 그러니까 율리아누스가 기독교를 논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활용했는가보다는 로마 제국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떻게 종교를 이용하였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포르퓌리오스 그러면 《이사고게》를 쓴 철학자 정도로만 알려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것이 플로티노스의 글을 모아서 《엔네아데스》라는 이름의 책으로 집대성한 사람이다. 《엔네아데스》라고 하는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에로스를 찾아서》에서 플로티노스의 미학에 대해서 써놓은 것도 있다. enneas라고 하고 하는 말은 숫자 9를 가리키는 헬라스어이다. 9개씩으로 해서 6권으로 묶었다고 해서 각권을 enneas라고 부르고, 9개들이란 뜻으로 Enneades라고 한다.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제6장 포르퓌리오스 - 철학자를 읽을 때 기독교와의 관계 속에서만 포르퓌리오스를 읽으면 안 되고, 포르퓌리오스를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가 물론 당연히 기독교 논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포르퓌리오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철학사를 공부할 때 헬레니즘 철학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헬레니즘 철학사라고 하면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 회의주의 정도만 다루는데 그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이런 포르퓌리오스 같은 고전 철학을 연구한 자들, 주석가들과의 아주 활발한 논쟁 속에서 철학 사상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포르퓌리오스 같은 사람을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빌헬름 빈델반트가 구도를 잡아놓은 철학사에서는 사실 헬레니즘 철학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빌헬름 빈델반트가 생각하기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철학의 역사는 어떤 구도에서 쓰여져야 하는가를 다룬 글이 Was ist Philosophie? (Ueber Begriff und Geschichte der Philosophie)에 잘 나타나 있다. 사실 저는 이게 철학사를 읽는 올바른 구도라고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읽으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굉장히 축소되고, 헬레니즘 시대의 pagan과 christian의 논쟁debate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운 성취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단절되는 허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해본다. 그건 철학사에 관한 얘기이고 철학을 공부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를 풍요로운 사상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것을 기독교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상 전반에 걸쳐서 풍요로움을 만들어낸 시대다 라고 생각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포르퓌리오스는 페니키아의 도시 튀로스 출신이다. 튀로스Tyros는 튀레Tyre라고 불리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지중해 동부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동서 교류의 장"이었다. 카이사레아에 가서 오리게네스의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로버트 그랜트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성서에 대한 비평과 이를 우의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는", 오리게네스는 우의적 해석에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교의 결정적 약점 상당수를 오리게네스가 노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성서에 대한 비평, 성서를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리게네스는 성서를 문헌학적으로 따져 묻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하는 근대적인 문헌 비평을 못하고 우의로 해석을 했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찾고자 한 더 깊은 영적 의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굉장히 살벌한 방법론을 포르퓌리오스가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로버트 글랜트는 포르퓌리오스가 보기에 오리게네스의 성서 비평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플라톤주의의 준비 작업이나 다름없었다 하는 것이다. 오리게네스의 성서 비평은 성서를 읽는 게 아니라, 성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플라톤주의적인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물론 포르퓌리오스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이다. 플로티노스의 글을 모아 《엔네아데스》라는 이름의 책으로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이긴 한데, 포르퓌리오스가 성서에 관해서는 신플라톤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서에 관한 신플라톤주의적 해석은 오히려 오리게네스에서 발견할 수 있고, 포르퓌리오스는 문헌 비평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교를 비판한 고대인 중에 가장 박식하고 날카로운 학자이고 여러 세대에 걸쳐 그리스도교 학자들을 자극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도 포르퓌리오스의 논변에 대응하고자 고심했고 "가장 박식한 철학자다"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라틴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에서 칼케돈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모든 논쟁들을 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다. 칼케돈 공의회가 451년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생몰연대를 보면은 430년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죽은 지 한 20년 후에 칼케돈 공의회가 열렸다.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니카이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칼케돈 공의회까지 이르는 이른바 기독교 정통 교리가 칼케돈 신조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끝 무렵에 있는 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를 라틴 기독교의 집대성이라고 축소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을 보면, 물론 오늘날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4세기, 5세기에 있어서 기독교 교리를 둘러싼 거의 모든 논쟁들은 그의 저작들에 담겨 있다. 그런데 그런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진지하게 고민했던 상대가 바로 포르퓌리오스이다. 물론 포르퓌리오스의 저작들은 오늘날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단편들로부터 구성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또는 《신탁으로부터의 철학》 이런 것들을 보면 포르퓌리오스가 얼마나 강력한 논쟁 상대였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칼케돈에 이르는 그 과정을 반드시 기독교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기독교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고전기의 종교들 또는 고전기의 사상에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또 고전기 사상들은 기독교에게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가 하는 논쟁의 시기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논쟁의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칼케돈까지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기독교 공의회의 역사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대개 그렇게 이해한다, 그 시기에 벌어졌던 pagan과 christian의 논쟁들은 헬레니즘 사상사를 풍요로움 속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논쟁들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신탁으로부터의 철학》이 상당히 살벌한 작품인데, 포르퓌리오스는 그리스도교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교를 인정했다는 것인데, 인정을 하되 이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전통 안에, 이 새로운 종교를 전통 종교과 조화를 시키려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조화를 시키려고 고민했다는 것은 아예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태도이다. 속속들이 이해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전통의 종교와 조화를 시키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성취된다면, 제대로만 성취된다면 기독교는 자기네들보다도 훨씬 오래된 전통을 가진 그리스 로마의 종교 안으로 녹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루이스 윌켄도 그런 점들을 그렇게 지적을 한다.
기독교 논박의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근거해서 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성서의 주석상의 문제들 그리고 문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오리게네스와는 다른 차원에서 성서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오리게네스는 우의적 해석을 해석을 했다면 포르퓌리오스는 〈구약성서〉 다니엘서에 관한 철저한 문헌 비평을 시도했다. 다니엘서가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 다니엘서의 저자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 즉 마카베오 시대의 위작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다니엘서인가. 다니엘서는 기독교 역사 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정체성의 하나가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이다. 다니엘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고,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그런 주장이 계속돼 왔다. 그러면 다니엘서가 사실은 위작에 불과하다 라고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옹호하던 호교론이 무너지고, 또 하나 다니엘서에서 유대교 성전이 궁극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인데, 다니엘서의 예언이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인질로 잡혀 있던 경건한 유대인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전서를 담은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버리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의 존립 근거를 담고 있는 예언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르퓌리오스가 다니엘서를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도들에게 이 텍스트에 대한 비판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다니엘서의 진술이 예언이 아니라 역사이고 역사로 해석할 때에만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진다 라는 사실들을 논쟁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서 24장 1절에서 예수가 예언을 한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기독교도들은 유대 종교가 정통성을 상실했고, 기독교가 그것을 이어받았다 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와 마태오 복음서에 대한 어떤 문헌학적인 논박이 이루어지면 기독교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바로 이 점을 율리아누스 황제도 이용했다고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다. 상당히 살벌한 논박이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강의노트 > 책담화冊談話 2021-25'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3), God & Philosophy, Ch. 2 (0) | 2024.05.28 |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5-2 (0) | 2024.05.24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5-1 (1) | 2024.05.24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8) [9] (1) | 2024.05.22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2), God & Philosophy, Ch. 2 (0) | 2024.05.20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1), God & Philosophy, Ch. 1 (0) | 2024.05.16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0), God & Philosophy, Ch. 1 (0) | 2024.05.13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4-2 (0) |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