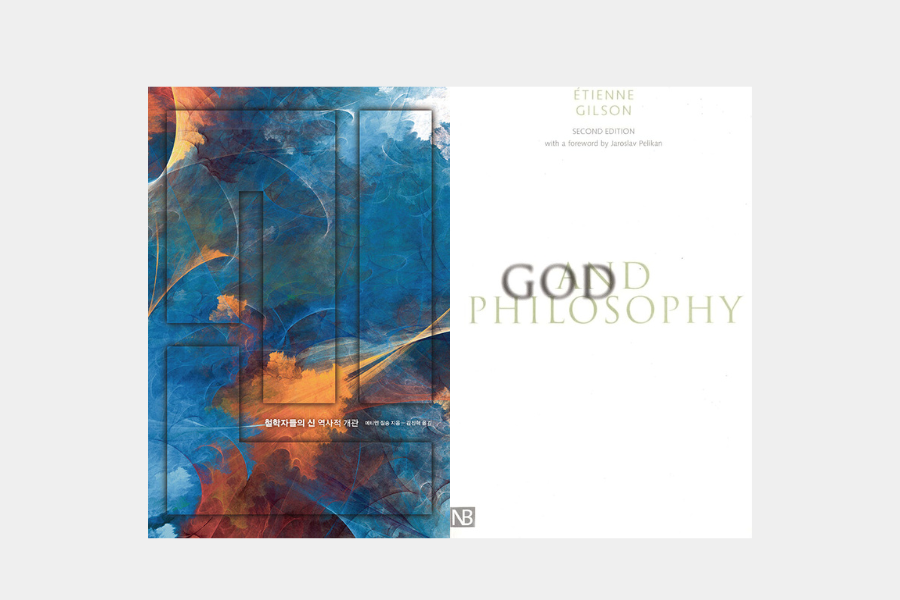
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https://booklistalk.podbean.com)에서 제공하는 「ε. Gilson, God & Philosophy」를 듣고 정리한다.
2024.05.12 ε. Gilson(10), God & Philosophy, Ch. 1
에티엔 질송, ⟪철학자들의 신 - 역사적 개관⟫(God and Philosophy, 2002)
텍스트: https://buymeacoffee.com/booklistalk/god-philosophy-ch-1
플라톤의 이데아는 분명히 하나의 관념론적 기획이다. 《파이돈》에서 '두 번째 항해' 얘기를 할 때 자연 세계로부터 하나의 일관성 있는 원리를 얻어낼 수는 없었다는 얘기를 한다. 이 부분은 《철학 고전 강의》에서 《파이돈》 부분을 설명한 것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아주 명백하게 소크라테스는 관념론적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이데아 이론을 내놓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관념론적 기획을 분명히 제시한다.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현전하는 세계가 아닌 앎이 구축하는 세계이다. 자연의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갑자기 자기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몸의 일부를 절제해내야 됐을 때, self identity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신체적인 것에 근거한다. self identity의 소멸과 등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아상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한 지속성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같은 사람이 《죽음과 죽어감 On Death and Dying》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치명적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자아의 상실감이 생겨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협상, 우울, 수용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고 얘기한다. 또는 이제 삶의 목표와 의미 이런 것들을 상실했을 때 또는 삶의 의미에 대한 급격한 반전이 일어났을 때 바로 self identity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현전하는 사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identity를 유지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모순에 처한 대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동일률이다. 동일률과 모순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자기 동일한 것, 참으로 있는 것, 비물질적인 것, 지속 가능한 것, 필연적인 것,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물론 이 지점에서 인지심리학을 들이대면서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논박이 안 된다. 맞는 말이다.
관념론의 기획은 어쨌든 "immaterial, immutable, necessary, and intelligible", 이게 질송의 얘기인데, "That is precisely what Plato calls Idea",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들, 동물, 인간 그러면 그 종의 상위에 있는 유類, genos를 가리킨다. 그러면 최상위에 있는 genos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과 같은 부동의 원동자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성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들, 즉 가지계, 즉 지성으로써 알 수 있는 세계의 것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eternal Idea, 그 이데아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세상에는 많은 종들이 있다. 동물 종도 있고 인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수없이 많은 이데아들 중의 이데아, 그러니까 Idea of Ideas, 최고의 이데아를 플라톤은 선善의 이데아라고 본다. 질송은 이를 신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왜 플라톤은 이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이데아와 신의 구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데아는 무엇이고 신은 무엇인가를, 플라톤이 이데아와 신의 관계에 대해서,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은 뭐라고 규정했고 이데아는 뭐라고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부터는 질송의 얘기와 질송을 exēgēsis하면서 플라톤에서 한번 다시 찾아본 것들 또는 예전에 읽었던 것들인데 그때는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섞어서 얘기하려고 한다.
53 존재한다는 것은 비물질적으로, 불변하고, 필연적이여, 지성으로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이데아Idea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4 Truly to be means immaterial, immutable, necessary, and intelligible. That is precisely what Plato calls Idea.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명했다. 질송은 플라톤은 명백하게 철학적인 설명 원리로서의 이데아를 발명했다invent고 얘기한다. 플라톤이 발명했다고 하면 없던 걸 만들어냈다 라기보다는 정교하게 다듬었다articulate고 보는데, 이것은 선의 이데아를 일자로, 그러니까 Hen Kai Pan(One And All), One으로 보게 되면 파르메니데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칼 알버트가 쓴 《플라톤 철학과 헬라스 종교》에서는 이데아를 최고 신으로 보고 있다. 플라톤에 있어서 선의 이데아를 하나의 Hen Kai Pan에서의 Hen으로 보고, 그 Hen을 질송처럼 철학적 설명 원리가 아닌 우주적 구성 원리로 보면, 칼 알버트 그리고 튀빙겐 학파의 얘기가 될 텐데,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질송은 이것을 설명 원리로 본다. philosophical principle of explanation으로 보는 것이지 construction의 원리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칸트의 플라톤주의가 가능하겠다. 이느 조금 이따 더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플라톤이, 질송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를 떠나서 일단 질송을 읽고 있으니까 질송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철학적 설명 원리로서 발명되었다. 그리고 did not invent the gods. 신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신은 어디서 온 것인가. 신을 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플라톤이 말하는 신들은 주어진 것이다. 그게 바로 플라톤 앞에 놓여 있는 사상 자원이다.
60 플라톤은 설명을 위한 철학적 원리로서 이데아를 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들을 발명해 내지는 안았습니다.
30 Plato, who seems to have invented the Ideas as a philosophical principle of explanation, did not invent the gods.
즉 "belief of men in the existence of the gods is a very ancient and therefore a venerable one."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 정당화가 필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오래된 것이다very ancient, 여기서 ancient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이것은 플라톤이 계수한, 전해받은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사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탈레스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겠다. 그러면 그것들을 플라톤은 버리지 않고, 플라톤은 그것들을 여러 신들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신들이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 신들은 인간에게도 신이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신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완성된 체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들이 본받는 하나의 paradeigma로서의 이데아를 발명해서 거기에 붙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현전하는 무수히 많은 가변적 사물들이 있고, 그 사물들의 유genos로서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본받는paradeigma 또는 그 신들이 본받고자 하는 설명 원리로서의 이데아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설명원리로서의 이데아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관념론적 기획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데아와 신의 구분을 철저하게 지킨다. 신은 생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헬라스 신화의 유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60 플라톤은 신들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매우 오래된 것이고 따라서 존중할 만하다고 거듭 되플이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하게 전해 내려온 믿음은 이성적인 정당화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31 Time and again the philosopher reminds us the the belief of men in the existence of the gods is a very ancient and therefore a venerable one. This avowedly inherited belief however is susceptible of some rational justificaion.
이렇게 보면 이데아는 불변의 것이니까 불변의 것은 그대로 있고 하늘에 바쳐져 있는 것이다. 《Politeia》 9권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바쳐져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인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신이다. 그리고 그가 가변적인 세계 또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질송의 표현에 따르면 변증법적 정화dialectical purification의 과정을 거쳐서, 지성의 세계 이데아를 향한다. 그렇게 해서 이데아를 향해 가서 이데아를 보는 사람은 신을 닮은 인간이 된다. 《법률Nomoi》에 따르면 신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신을 닮은'이라는 말도 되고 신을 닮고자 한다는 게 신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인간 중에서도 범형이 되는 또는 범례가 되는 존재가 있을 텐데 그 존재가 바로 이제 철학자다. 질송은 remebmer라는 단어를 써놓았데, "철학자는 자신의 신성을 기억하고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인간 영혼입니다." 그렇게 철학자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는데, 번역을 할 때 remebmer는 상기想起 anamnēsis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철학자는 자신의 신성을 '상기'하고 신처럼 행위하는 '신을 닮은' 인간 영혼이다. 즉 신을 담고자 하는 인간 그리고 신적인 영혼을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인간만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에는 그런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
59 철학자는 자신의 신성을 기억하고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인간 영혼입니다.
29 A philosopher is a human soul which remebmers its own divinity and behaves as becomes a god.
그러면 그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인간은 어떻게 양육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다. 그게 바로 paideia이다. 《법률Nomoi》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paideia를 받아야 되는데, 그 paideia는 trophē라는 것에 한 한다. "아이 적부터 [사람으로서의] 훌륭함(덕: aretē)과 관련된 교육, 곧 올바르게(meta dikēs) 다스릴 줄(arkhein)도 그리고 다스림을 받을 줄(arkhesthai)도 아는 완벽한 시민(politēs teleos)"이라고 되어있다. meta dikēs는 올바르게, dikē가 올바름, meta와 kata는 비슷하지만 살짝 구별된다. 그리고 arkhein는 다스린다, arkhia는 다스림이다. kyriarkhia는 주권sovereignty과 연결된다. 그다음에 arkhesthai는 다스림을 받을 줄도 아는, 올바르게 다스릴 줄도 그리고 다스림을 받을 줄도 아는 완벽한 시민. 왜 그는가. politēs teleos는 완벽한 시민인데, 그 목적을 성취한, 끝판왕에 이르른 시민이다. 이런 시민이 사실 민주정 국가의 시민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법률에 자기가 복종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과잉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논변들을 동원하면 굳이 정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얘기이다. 여기 올바르게 다스릴 줄도 그리고 다스림을 받을 줄도 아는 완벽한 시민으로 되는 것에 대한 "욕구와 사랑을 갖는 자로 만드는 교육"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paideia이다.
그러면 이 paideia는 다른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양육이라고 하는 genos에 속하는 것인데, 양육이라고 하는 genos에 속하는 것 중에 paideia만을 따로 떼어내서 paideia라고 일컫고자 하는데, 양육 아래 paideia가 있는데, paideia 옆에 그러니까 양육에 속하는 중에 하나인 paideia 옆에 다른 종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종들과 paideia의 종차, 차이는 무엇인가. "돈벌이나 체력관 관련된 어떤 분야 또는 그 밖의 것으로서, 지성(nous)과 정의(올바름: dikēs)와는 상관없는, 어떤 재주를 목표로 하는 양육"은 paideia와 구별되는 것이다. 《법률Nomoi》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정치가Politikos》를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온다. 그 종과 유를 이렇게 나누는 그 분류에 대해서 나온다. 이것이 형이상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육학pedagogy이기도 한 것이다. "어떤 재주를 목표로 하는 양육은 저속하고 자유민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며 전혀 교육이라 불릴 가치가 없는 것", 즉 paideia라고 불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며"로 번역된 단어가 한 단어인 aneleutheros이다. 영어로 말하면 eleutheros가 free이고, aneleutheros가 unfree이고, 명사형인 eleutheria가 freedom이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freedom은 아닐지라도 플라톤에 있어서 trophē 중에 하나인 paideia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민은 politēs teleos, 그 사람은 올바르게meta dikēs 다스릴 줄arkhein도 알고, 다스림을 받을 줄arkhesthai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상태에 처한 사람인가, 자유로운eleutheros 사람이다.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고 절대적 자유에 이른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니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정치학적으로만 규정할 필요는 없다. 질송의 책을 꼼꼼하게 읽는다 해도 그냥 질송만을 정리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질송의 얘기에 덧붙여서 뭔가를 좀 더 내놓는 것이 말하자면 scholarly working이다.
그렇다면 신적인 인간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사실 본받아야 되는 존재는 신들 중에서도 dēmiourgos이다. 즉 우주는 신들로 가득 차 있는 우주를 만드는 신을 본받아야 된다. 이 dēmiourgos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주와는 다르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주는, 《그래서 그들은 로마는 보았다》에서 갈레노스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와 관련된 것들을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교리가 생겨났으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creatio ex nihilo와는 조금 구별된다. 그것은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dēmiourgos는 명백하게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바라보며", 즉 이데아이다, "이런 걸 본(paradeigma)으로 삼고서, 자기가 만드는 것이 그 형태(모습: idea)와 성능(dynamis)을 갖추게 할 경우에라야", 그러니까 그 이데아의 모습 바라보면서 이데아를 본받아서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완성되어야만,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본받기mimesis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에서도 mimesis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는 건 아니고, 플라톤에서의 mimesis는 본받는 것이다. 모방이 아니라 그냥 뭘 보고 그대로 베기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완전하게 mimesis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이 바라보기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적인 의미에서의 mimesis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완성되어야만,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됩니다"라고 할 때 이 아름다운 것이 꼭 미감의 측면에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리에 가까운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 만드는 이가 이 생겨난 것을 바라보며",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생성의 과정에 있는 것,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그걸 바라보며 이렇게 생겨난 것, 변화의 과정에 있는 "이 생성물을 본으로 삼는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못 됩니다." 본으로 삼는 게 두 종류인데 무엇을 본으로 삼는가. 《Politeia》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받는 능력은 있다. 플라톤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본받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게 진리 탐구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시선을 어디를 향하느냐가 플라톤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 시선을 무엇을 본받는가,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곳으로 자신이 시선을 향하는가에 달려 있다. 조금 도식적으로 얘기해보면 영원한 이데아,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즉 자기동일적 이데아, self identity를 유지하고 있는 이데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존재가 dēmiourgos, 만드는 이, 우주를 만드는 신이다. 그런 다음에 물론 인간도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이데아를 바라보기도 해야 된다. 이것도 가능하겠고 《Politeia》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Politeia》에서는 일단 영원한 이데아를 바라보는 곳으로 간다. 동굴의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 "최종적으로 그리고 각고 끝에 보게 되는 것이 ‘좋음의 이데아’이네…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훌륭한) 것의 원인(aitia)이라고, 또한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는 빛과 이 빛의 주인을 낳고, ‘지성에 의해서[라야] 알 수 있는 영역’에서도 스스로 주인으로서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장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prattein) 하는 자는 이 이데아를 보아야만(idein)한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하네." 이게 이데아의 규정인데, 동굴 안에 있던 자 중에 누군가가 그 동굴 바깥으로 가서 각고 끝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올라간 끝에 보게 되는 것이 이데아이다. 그 사람이 《Politeia》의 철학적 정치가인데, 《Politikos》에서는 신들이 다스리던 때를 앞에 얘기한다. 그러니까 신들이 다스리던 때에는 인간이 할 일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신들이 우주의 축을 놓아버렸을 때 막 제멋대로 돌아가니까, 이제 신들이 어떻게 다스렸나를 보존하고 있었고 그렇게 보존한 것을 보고 참조를 하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정치가Politikos이다. 《Politikos》의 정치가는 dēmiourgos를 본받는 것이다. paideia라고 하는 것, 앞서 《법률Nomoi》에 나오는 paideia는 무엇인가. 여기는 이데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없다. 사실 정치가라고 하는 존재는 철학자이기도 하니까 dēmiourgos를 본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데아를 본받기도mimesis 하고 둘 다겠다. 《Politeia》가 좀 더 원론적이라면 《Politikos》는 정치가의 소명vocacio을 가져다가 얘기하기 위해서 좀 더 hierarchy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의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구별이 좀 있다는 것, 구분이 아니다, dēmiourgos를 본 받든 이데아를 곧바로 본받든 간에, 그 최상위에 있는 것은 이데아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건 같다. 《Politeia》의 정치가하고 《Politikos》의 정치가 모두 다 본받는 것, 상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본받는 것은 같은데, 곧바로 직접적으로 무엇을 본받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르겠다.
《법률Nomoi》은 양육의 문제도 있고, 어떤 nomos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니까, 《법률Nomoi》은 《Politikos》와 병행하는 것이겠다. 그러니까 《Politeia》, 《Politikos》, 《Nomoi》 이 3개가 좌우로 나란히 놓여 있다면, 《Politeia》가 총론 쪽에 좀 더 가깝고 《Politikos》, 《Nomoi》은 각론에 가까운데, 《Politikos》는 우주론적인 부분은 좀 적고, 정치가가 하는 일들에 집중해 있고 그다음에 《Nomoi》는 우주론보다는 nomos, 말 그대로 법률에 집중하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놓여 있는 게 이데아가 있는 세계 또는 이데아 아래의 세계, 이데아 바로 아래에 있는 세계가 인간 세계가 아니라 우주이다, 인간 세계가 우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티마이오스Timaios》이다. 그러니까 《티마이오스Timaios》에서 dēmiourgos를 얘기하는 것이겠다. 플라톤의 4개의 텍스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티마이오스Timaios》가 가장 밑바탕에 나오는 것이다. 《티마이오스Timaios》는 dēmiourgos 얘기를 하고 그 dēmiourgos를 본받아서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리고 《Politeia》에는 dēmiourgos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인간이 곧바로 이데아를 본받는 것으로 가니까 그렇다.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인간이 해야 할 일들만 다룬다 라고 한다면 《Politeia》가 훨씬 더 휴머니스틱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자잘한 것들은 차이가 있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 이데아가 최고의 신이라고 할 만한데, 질송의 지적처럼, 플라톤은 이를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면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Politeia》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리고 각고 끝에 보게 되는 것이 좋음의 이데아"이고, "또한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prattein) 하는 자", 이 부분을 《Politeia》라고 하는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이걸 보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한다. 슬기롭게 아는 자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슬기롭게 행하기까지 해야 된다. 슬기롭게 행하기prattein까지 하려면 이것은 정치가의 영역으로 가는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prattein) 하는 자는 이 이데아를 보아야만(idein)한다"고 했는데, idein 부분이 thēoria이다. 여기서 플라톤은 idein이라고 했는데, 본다가 이론이고, thēoria이다. 슬기롭게 행한다는 것은 prattein, 그러면 praxis인데, 사적으로 행할 수도 있다. 그냥 혼자 방에 앉아서 이데아를 보고 사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플라톤은 분명히 공적으로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공공영역에서도 올바름을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장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prattein) 하는 자는 이 이데아를 보아야만(idein)한다"고 하는 자는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적 정치가, 철학적 통치자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것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본래적으로는 플라톤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이데아를 보는 것만으로는 완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플라톤의 《Politeia》이든 《Politikos》이든 《Nomoi》인든 이 세 개의 텍스트에서 진리를 아는 자는 정치가Politikos이다.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는 것, 앞서 《Nomoi》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meta dikēs) 다스릴 줄(arkhein)도 그리고 다스림을 받을 줄(arkhesthai)도 아는 완벽한 시민(politēs teleos)",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피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그 시민이 정치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유민이다, eleutheria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페르세우스 프로젝트에서 보면 644a의 단어가 illiberal로 되어 있다. 대체로 eleutheria를 freedom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unfree라고 번역을 해도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석을 달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앞서 질송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플라톤에 있어서 이데아는 설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질송은 정리를 했다. 설명의 원리는 요청된 것이다. 설명을 위해서 이데아를 요청한 것이다 라고 보면 플라톤에서의 이데아의 위치가 좀 복잡해진다.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으로만 나가버리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골치아프다. 그것은 명목상 그런 것일 뿐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유명론자들처럼 명목상 그런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질송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형이상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어쨌든 질송은 이것을 설명 원리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질송이 설명 원리라고 한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담아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지' 이 정도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질송의 입장을 주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하는 건 너무 많이 주석을 하는 것일 것 같다. 여튼 《Politeia》에서 호메로스의 시에 나타난 신들과 인간들의 모습을 비판을 한다. 이데아를 본받는 신들이 바로 dēmiourgos이고 그 dēmiourgos가 만들어내는 우주, 우주는 이제 신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우주의 일부인 인간은 영혼이 신적임을 상기하고 paideia를 통해서 eleutheria에 이르러야 한다. 읽은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플라톤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하겠다.
'강의노트 > 책담화冊談話 2021-25'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8) [9] (1) | 2024.05.22 |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7) [8] (0) | 2024.05.21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2), God & Philosophy, Ch. 2 (0) | 2024.05.20 |
| 책담화冊談話 | ε. Gilson(11), God & Philosophy, Ch. 1 (0) | 2024.05.16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4-2 (0) | 2024.05.10 |
| 책담화冊談話 | 시학 강독 4-1 (0) | 2024.05.10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6) [7] (0) | 2024.05.10 |
| 책담화冊談話 |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5) [6] (0) | 2024.05.09 |